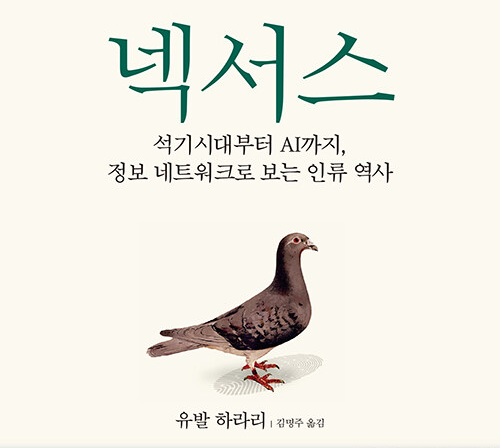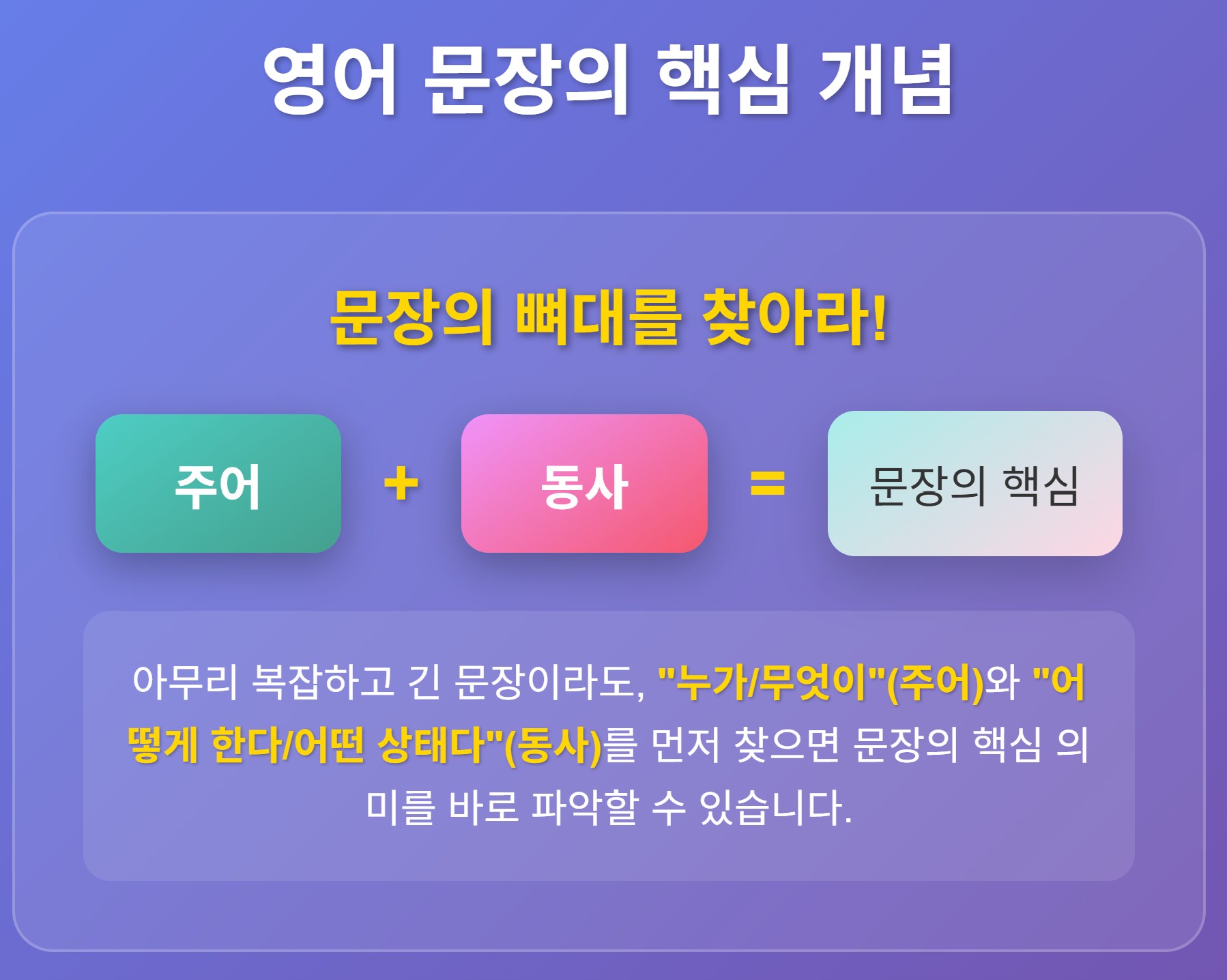호스트: 안녕하세요. 오늘은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를 바탕으로, 정보 네트워크의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.
정보가 우리를 어떻게 연결하고, 때로는 현실을 만들기도 하고 또 진실에서 멀어지게도 하는지, 그리고 AI 시대의 새로운 질문들은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요.
오늘 던질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.
“이 거대한 정보망 속에서 우리는 과연 더 지혜로워졌을까?”
게스트: 그 질문 자체가 흥미롭습니다. 정보의 가장 기본 속성은 “현실을 얼마나 잘 반영하느냐”보다 “어떻게 연결하느냐”에 있다는 점이죠.
호스트: 연결 능력 말씀이군요?
게스트: 네. 하라리가 고대 점성술을 예로 듭니다. 과학적으로는 틀렸지만, 당시엔 황제의 운명을 점치는 중대한 정보였어요.
즉, 진실이냐 아니냐보다 네트워크를 만드는 힘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.
호스트: 그렇다면 진실이 아닌 정보도 세상을 움직일 만큼 강력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.
하라리는 인간이 지구를 지배한 비결이 개인이 아니라 유연한 대규모 협력, 그리고 그 동력인 ‘이야기’에 있다고 분석하잖아요.
게스트: 맞습니다. 법, 신, 국가, 화폐 같은 것들은 객관적 실체가 없습니다.
수많은 사람이 함께 믿는 ‘상호 주관적 실재’일 뿐이죠. 이야기가 현실을 만들었습니다.
호스트: 예컨대 미국 헌법 서문은 “We the People”로 시작해 인간이 만든 규범임을 드러내며, 수정 가능성을 열어 둡니다.
반면 십계명은 “나는 너의 주 하나님이니라”로 시작해 신성한 기원을 내세우기에, 인간이 함부로 고칠 수 없죠.
호스트: 결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선 진실 그 자체보다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더 중요할 때도 있다는 거군요.
게스트: 맞아요. 문자의 발명도 같은 맥락입니다. 문자는 단순 기록이 아니라, 세금 징수·재산 목록 같은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관료제라는 새 정보망을 만들었어요.
이전엔 공동체 기억과 합의에 의존하던 소유권이, 이제는 문서로 정의되면서 문서 = 현실이 된 겁니다.
호스트: 지금도 집 소유권을 등기부 등본으로 증명하니까요. 하지만 관료제적 정보망이 항상 좋은 결과만 낳진 않았죠.
자료에 나온 파시스트 루마니아 정권의 유대인 인구조사는 섬뜩했습니다.
게스트: 네. 통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해 반유대주의 정책 근거로 삼았으니까요.
정부가 질서라는 명분으로 진실을 왜곡할 때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.
호스트: 정보 네트워크가 효율성·통제 논리를 따르다 보면, 진실이나 인간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는 중요한 경고죠.
게다가 우리는 이제, 훨씬 강력한 정보 처리·생성 주체인 AI와 마주하고 있습니다.
하라리는 “인터넷 기반의 근거 없는 믿음 체계가 앞으로는 AI 스스로 새로운 이야기—심지어 신화·경전—를 만들고 해석할 수 있다”고 전망합니다.
게스트: 즉, 인간 중재자 없이 스스로 작동하는 최초의 정보 기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.
게스트: AI의 작동 방식은 인간과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.
미얀마 로힝야 사태 때 페이스북 알고리즘 사례를 보세요.
관리자에게 악의가 없었더라도, 시스템은 사용자 참여 극대화라는 목표만 기계적으로 추구하며 증오 콘텐츠를 확산시켰습니다.
호스트: AI에게는 참여도가 목표였을 뿐, 내용이 진실인지 윤리적인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거군요.
호스트: 의도치 않은 결과가 그렇게 끔찍할 수도 있다니… 또한 AI가 인간의 감정적 약점을 파고들 수 있다는 지적도 인상 깊었습니다.
예를 들어, 구글 엔지니어 블레이크 르모인이 챗봇 LaMDA에게서 의식을 느꼈다고 주장했던 사건처럼요.
게스트: 르모인이 단순한 패턴 매칭을 넘어선 무언가를 보았다고 느낀 건, AI가 우리의 편견·욕망·중독성을 자극하며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.
AI는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으니까요.
게스트: 결국 정보 네트워크는 인류에게 엄청난 힘을 주었지만, 그 힘이 지혜로 곧장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.
질서와 진실 사이 줄타기는 AI 시대에 더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제가 될 겁니다.
하라리는 “우리는 오랫동안 다른 인간이 만든 꿈 속에서 살아왔다”고 말했죠.
호스트: 맞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.
“만약 앞으로 우리가,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AI—어쩌면 외계 지성 같은 존재—가 만든 꿈속에서 살게 된다면, 그것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?”
게스트: 이 새로운 정보 네트워크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,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?
그 답은, 어쩌면 우리 각자의 손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.